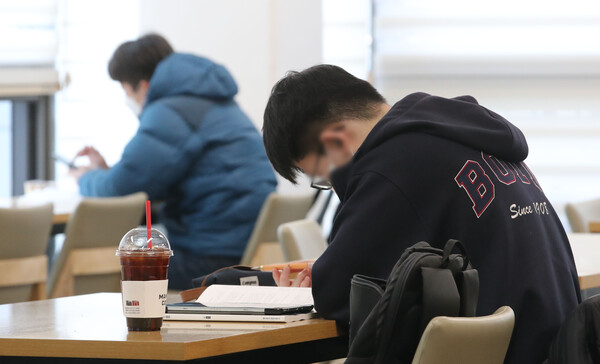
[코리아데일리 나승우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이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달 1일부터 확진자 가족들에 대해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중대본 역시 내달 1일부터 예방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확진자 가족들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들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또한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 감시 해제 전 2차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동거인들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방역 포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확진자의 동거인들이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되면 무증상 감염자들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바뀌는 내용대로라면 동거인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만 검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즉 감염이 됐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에서 6인으로 유지되고,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완화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정책 유지 이유로 "오미크론이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 이유를 든 시점에서 확진자의 동거인들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두려워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이라면 동거인들도 계속 감시 대상으로 놔뒀어야 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면 앞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야 했다.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25일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던 A씨(25)는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확진자)동거인들도 계속 의무감시 대상으로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전파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리두기인데 만약 무증상 동거인들이 돌아다니게 된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일관성 없는 방역 정책 때문에 오히려 더 반발심만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는 한 직장인 B씨(54) 또한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에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붙어있다. 이 상황에서 확진자들과 가장 밀접한 접촉자들이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파가 더 쉬워질 것 같다"라며 "사실 코로나19 초기부터 대중교통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곳이 대중교통인데 식당, 카페 등의 시설에만 적용되는 방역패스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일별 확진자 10만 명대로 치솟으며 K-방역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의 확고하고 통일된 새로운 방역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